
5회 | 포토갤러리 | - 게시판담당 : 박화림
글 수 1,334
 |
|
오규원<사랑의 기교 2 ―라포로그에게 >
-'사랑'은 멍청한 말…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기교-
사랑이 기교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사랑이란 이 멍청한 명사에 기를 썼다. 그리고 이 동어 반복이 이 시대의 후렴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도 나는 이 멍청한 후렴에 매달렸다. 나뭇잎 나무에 매달리듯 당나귀 고삐에 매달리듯 매달린 건 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사랑도 꿈도. 그러나 즐거워하라. 이 동어 반복이 이 시대의 유행가라는 사실은 이 시대의 기교가 하느님임을 말하고, 이 시대의 아들딸이 아직도 인간임을 말한다.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기교, 나의 하느님인 기교여. 
|
2008.10.23 08:37:22 (*.12.199.161)
젊은날에 찐하게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뭔지도 알고
질투도 알겠는데,,,,
워낙 문외한으로 살아서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건
무한대적인 사랑은 절절이 느낀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부모에 대한 사랑도...
연인에 대한 사랑도...
모두 인간이기에 有限하겠지.
이미 그런것들을 알아버렸기에
미리 기대도 않고 실망도 안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오로지 AGAPE 的인 ![]() 만 나는 원한다.
만 나는 원한다.
2008.10.23 12:05:17 (*.172.221.40)
원래, 시도 그림도
그 해설이 더 괜찮더구나.
'저녁 거리에 서서 물끄러미 추억을 바라본다....'
저녁에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꼭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나는
추억을 바라보는 걸까?
결국 인간의 삶이 '사랑'을 찾아가는거지.
아가페든, 에로스건.....
저 위에 그림도 참 좋구나.
벽에 비친 그림자로 상념에 잠기게 하는 그림!
그 해설이 더 괜찮더구나.
'저녁 거리에 서서 물끄러미 추억을 바라본다....'
저녁에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꼭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나는
추억을 바라보는 걸까?
결국 인간의 삶이 '사랑'을 찾아가는거지.
아가페든, 에로스건.....
저 위에 그림도 참 좋구나.
벽에 비친 그림자로 상념에 잠기게 하는 그림!
2008.10.23 14:43:36 (*.16.127.122)
남녀 사이만 사랑이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겠지.
만일 사랑이란 말 자체가 남녀간의 명제라면 젊은 시절에 더 어울리는 얘기인 건 틀림이 없어.
요즈음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에서 나온 노년의 사랑은 보는 이를 많이 민망하게 만든 건 사실이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사랑`으로 맺는다면이란 가정법은 가정법 문장에서만 존재하리라는 생각.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는 생각지 않아, 있지 물론 다만 드믈 뿐.
사랑과 질투라는 불협화음의 조율이 지혜를 키우리라.
나도 추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문귀가 마음을 두드리더라.
이상하게도 그 거리는 인천이 아니고 세종로,태평로 명동.... 그런 곳이야.
인천은 너무 고향 같아 추억도 쟁여지지 못하는... 현재진행형의 삶터라서 그럴까?
기교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是是非非를 넘어 살 수있는 세상이 그리웁다.
2008.10.23 14:55:26 (*.16.127.122)
(오규원 시인의 시 해설)<펌>
가벼운 교통사고를 몇 번 겪고 난 뒤 조금만 차가 속도를 내도 앞 좌석의 등받이를 움켜쥐고는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문득 근심에 젖는, 죽고 난 뒤의 팬티가 깨끗할지 아닐지에 대해 걱정하는 인간이 있다.
시인 오규원(1941~2007)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인간형이다.
인간의 세속적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토록 민활하게 '까발리는' 시가 등장한 것도 오규원에게서 처음이 아닐까 싶다.
말하자면 그는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 속에 고고하게 들어앉아 있는 시에 대해 이렇게 일갈한다.
"詩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詩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生밖에" (〈용산에서〉).
다시 말하면, 생은 치장된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낡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으므로 마냥 근사한 것만이 삶이 아니며 시는 그 삶 전체를 노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삶을 사전에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사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죄로 나는 사전에 없지만 이 지상에 있는 삶의 下命(하명)대로 살아 있는 동안은 路上(노상)에서 계속 삶을 동냥하겠습니다…"
사전에 없지만 지상에 있는 그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늘상 눈물겨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아파하거나 외로워 하는, 모든 마이너리티적 삶의 구색들일지 모르겠다.
위의 고백처럼 사전적 의미의 사랑은 오규원 시인에겐 사랑이 아니다.
우리를 늘 구속하던 개념들, 도덕들을 그는 이렇게 풍자한다.
"아 어디로 갔나 여기 있어야 할 사랑 愛. 忠 孝는 지금도 있는데, 아 어디로 갔나. 사랑 愛, 미운 오리새끼.(…)"(〈한 나라 또는 한 여자의 길-楊平洞 3〉)"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가르치는 교육! 정작 '사랑(愛)'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지배관념! 늘 '미운오리새끼'의 운명인 '사랑'이므로 이제 사랑은 '기교'를 낳을 수밖에 없다.
'기교'가 속임수적 요소를 가진다는 부정적 의미에서 탈출하여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적 관념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멍청한 명사'가 '멍청한 후렴'인 시대, 그것에 매달려 보았지만 '사랑도 꿈도' 비참했던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은 한 시대, 아니 모든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기교이며 신의 기교라는 자각은 사랑의 사회적 차원을 가장 아름답고 풍자적으로 제시해 준다......<후략>
가벼운 교통사고를 몇 번 겪고 난 뒤 조금만 차가 속도를 내도 앞 좌석의 등받이를 움켜쥐고는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문득 근심에 젖는, 죽고 난 뒤의 팬티가 깨끗할지 아닐지에 대해 걱정하는 인간이 있다.
시인 오규원(1941~2007)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인간형이다.
인간의 세속적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토록 민활하게 '까발리는' 시가 등장한 것도 오규원에게서 처음이 아닐까 싶다.
말하자면 그는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 속에 고고하게 들어앉아 있는 시에 대해 이렇게 일갈한다.
"詩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詩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生밖에" (〈용산에서〉).
다시 말하면, 생은 치장된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낡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으므로 마냥 근사한 것만이 삶이 아니며 시는 그 삶 전체를 노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삶을 사전에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사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죄로 나는 사전에 없지만 이 지상에 있는 삶의 下命(하명)대로 살아 있는 동안은 路上(노상)에서 계속 삶을 동냥하겠습니다…"
사전에 없지만 지상에 있는 그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늘상 눈물겨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아파하거나 외로워 하는, 모든 마이너리티적 삶의 구색들일지 모르겠다.
위의 고백처럼 사전적 의미의 사랑은 오규원 시인에겐 사랑이 아니다.
우리를 늘 구속하던 개념들, 도덕들을 그는 이렇게 풍자한다.
"아 어디로 갔나 여기 있어야 할 사랑 愛. 忠 孝는 지금도 있는데, 아 어디로 갔나. 사랑 愛, 미운 오리새끼.(…)"(〈한 나라 또는 한 여자의 길-楊平洞 3〉)"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가르치는 교육! 정작 '사랑(愛)'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지배관념! 늘 '미운오리새끼'의 운명인 '사랑'이므로 이제 사랑은 '기교'를 낳을 수밖에 없다.
'기교'가 속임수적 요소를 가진다는 부정적 의미에서 탈출하여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적 관념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멍청한 명사'가 '멍청한 후렴'인 시대, 그것에 매달려 보았지만 '사랑도 꿈도' 비참했던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은 한 시대, 아니 모든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기교이며 신의 기교라는 자각은 사랑의 사회적 차원을 가장 아름답고 풍자적으로 제시해 준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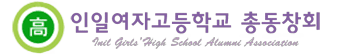




오래 된 책을 펼칠 때 툭 발등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만난 적 있을 것이다.
그곳엔 오래 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눈이 밝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외로웠을 때, 지금보다 훨씬 미숙했을 때의 자화상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쯤 그때 모습 그대로 어룽거리며 걸어 나온다.
그 중 십중팔구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미 화석이 된, 그 가슴 에이는 '사랑의 시간'을 미리 떠나가서 뒤돌아보는 시가 바로 이 시다. 그는 죽음을 미리 예감한 것만 같다.
'사랑'이란 말은 생각의 양, 즉 '사량(思量)'의 변형이라는 설이 있다.
기형도(1962~1989)는 마음에 상념이 얼마나 많았으면 '공장을 세웠'다고 했을까.
사랑이 아니라면 그만한 상념일 수는 없으리. 그러나 그 '너무나 많은 공장'의 생산물들을 기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탄식'만을 남겼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질투'라니! 잔인하다.
질투만 없어도 사랑은 얼마든지 할 만한 것 아니던가!
질투는 그래서 사랑의 저주일지도 모를 일. 이 질투를 앓는 자, 지금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었다.
그 청춘이 얼마나 긴 그림자를 남겼는지는 여백에 속한다.
기형도의 유품 중 어느 책갈피엔가 지금도 이러한 글귀가 적힌 쪽지가 꽂혀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하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인생은 사랑을 찾아 헤매다 죽는 것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 사랑의 농도를 열정이라 하리라.
그는 침침한 심야의 극장에서 그만 청춘의 마지막 숨결을 놓아버렸다.
사후에 나온 유일한 그의 시집은 이후 90년대에 등장하는 젊은 시인들에게 강력한 자기력을 띤 것이기도 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