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2,306
<수필>
황매화의 재(齋)
이정원
사월이 끝나갈 무렵 찾은 창덕궁엔 피어있는 꽃이 별로 없었다. 정문인 돈화문을 거쳐 명당수를 가로지르는 금천교를 지나, 순종이 타고 다니던 마차와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어차고 근처에 이르러서야 능수벚나무 한 그루를 만났을 뿐이었다. 그것도 꽃잎이 바람에 거의 다 날아 가버리고 없었다.
궁의 뒤쪽에 자리 잡은 정원으로 향하는 길목의 꺾인 담 밑에서 선조 때 심어졌다는 홍매화를 만났으나, 그 또한 이미 꽃이 진 뒤였다. 명나라에서 보내온 것으로 수령이 사백 년이 넘었다니 어지간한 궁의 역사는 다 알고 있을 법한 꽃나무인데, 그 꽃을 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
창덕궁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뒤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했다가 태종이 다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지어진 궁이라, 정궁(正宮)이 아닌 이궁(異宮)의 성격을 띠고 있다. 궁의 여러 전각보다는 태종 때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정원의 아름다움이 빼어나 그 정취를 맛보려는 이들이 워낙 많은 탓에, 보존을 위해 공개하지 않은 지도 꽤 됐다.
그것이 얼마 전에 풀리기는 했지만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만 다닐 수 있었다. 그 날의 관람은 특히 전각을 돌보는 쪽보다는, 궁의 내의원 동쪽 담장을 끼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난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펼쳐지는 후원 관람이 주였다.
부용지를 중심으로 그 못에 두 다리를 담그고 서 있는 정자인 부용정과 주합루와 영화당을 돌아보고, 애련지와 애련정을 지나 다시 승재정과 존덕정을 거쳤다. 후원의 그 많은 정자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인조 때부터였다는데, 정의정 앞쪽 암반에 샘을 파고 물길을 돌려 폭포를 만든 곳에 옥류천이라고 새겨져 있다.
궁 안에 이렇게 깊은 정원을 꾸며 놓았으니, 이곳에 머문 비빈들이 굳이 궁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사계절의 정취를 다 느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내심 부럽기까지 했다. 그 마음을 안고, 순조 때 왕세자였던 익종의 청으로 아흔아홉 칸인 사대부집을 모방해 지었다는 연경당을 돌아봤다.
그리고서 궁의 옆문인 금호문을 향해 담을 끼고 걸어 나올 무렵이었다. 그 길가에서 사월 끝자락의 햇빛을 안고 피어있는 황매화를 만나게 될 줄이야. 아니, 후원으로 향하는 문을 들어서기 전 낙선재 입구에서 난 벌써 그 꽃나무와 마주쳤었다. 그 재(齋)에 발을 들여놓는 여인들의 심정을 다섯 장 노란 꽃잎에 담아내기라도 하듯, 가지가 휘도록 피어있는 황매화 한 그루가 마음을 줄곧 뒤로 끌어당긴 것도 사실이었다.
창덕궁에서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궁궐지>에 창경궁에 속한다고 되어있는 낙선재는 깊은 슬픔을 안은 궁의 여인들이 기거하다 간 곳이다. 헌종이 즉위한 지 십삼 년 되던 해에 지어졌다는 -궁의 화려함보다는 여염집의 조촐함이 더 배어있는- 그 집은 원래 총애한 여인을 위한 곳이었다고 한다.
임금이 되고서야 혼례를 올린 그분은 왕비로 뽑힌 여인보다는 간택에서 떨어진 한 여인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창덕궁에 있는 왕비전에서 떨어진 창경궁에, 그러면서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처소를 마련해 머물게 했다. 그 후에는 국상을 당한 왕비와 후궁들을 기거하게 했다는데, 그 바깥 쪽 뜰에 관을 발인할 때까지 두었던 빈전(殯殿)으로 보이는 사각정이 남아있다.
몇 년 전 조경하는 사람들 모임에 끼어 낙선재 일곽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석복헌과 수강재와 취운정과 한정당 등을 대하는 동안, 순종이 승하하자 그곳에서 여생을 보낸 윤비와 영친왕이 타계한 후 역시 그곳에 머물다 떠난 이방자 여사의 슬픔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일본에 끌려갔다 돌아온 덕혜옹주도 끝내는 거기서 세상을 등졌으니, 낙선재야말로 왕실 여인들의 비운한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일 게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피어있는 황매화의 한 종류인 죽도화는 노란 겹꽃을 수없이 피워 늦봄을 밝히는 꽃이지만 애석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왕이 승하한 후, 혼자 남겨진 왕의 여인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할 운명을 안고 들어서는 낙선재의 문 앞에서 그녀들이 흘렸을 눈물이 황매화로 피어난 것은 아닐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 꽃에 담겨 있는 전설 또한 애달프다. 한 왕이 주위를 물리치고 사냥을 나갔다가 비를 만났는데 마침 산기슭에 허름한 집이 있어 찾아갔다. 한 여인이 나오기에 비를 가릴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얻자 했더니, 아무 말없이 마당에 핀 황매화 한 가지를 꺾어 주고는 돌아섰다.
황매화는 꽃이 많이 피나 열매가 없으므로, 비를 가릴 수 있게 드릴 만한 것이 없어 안타깝다는 뜻이었다. 그건 어쩌면 건넬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뜻도 될 테니, 지아비인 왕을 잃은 여인들의 심경을 대신 한다 여겨도 되지 않을까. 봄의 끝자락에 찾아간 궁에서 꽃처럼 화사한 여인들의 자태대신 홀로 남겨진 비빈들의 처연함을 느끼고 돌아오자니, 내 봄의 뜨락에까지 황매화가 피어난 기분이었다.
황매화의 재(齋)
이정원
사월이 끝나갈 무렵 찾은 창덕궁엔 피어있는 꽃이 별로 없었다. 정문인 돈화문을 거쳐 명당수를 가로지르는 금천교를 지나, 순종이 타고 다니던 마차와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어차고 근처에 이르러서야 능수벚나무 한 그루를 만났을 뿐이었다. 그것도 꽃잎이 바람에 거의 다 날아 가버리고 없었다.
궁의 뒤쪽에 자리 잡은 정원으로 향하는 길목의 꺾인 담 밑에서 선조 때 심어졌다는 홍매화를 만났으나, 그 또한 이미 꽃이 진 뒤였다. 명나라에서 보내온 것으로 수령이 사백 년이 넘었다니 어지간한 궁의 역사는 다 알고 있을 법한 꽃나무인데, 그 꽃을 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
창덕궁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뒤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했다가 태종이 다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지어진 궁이라, 정궁(正宮)이 아닌 이궁(異宮)의 성격을 띠고 있다. 궁의 여러 전각보다는 태종 때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정원의 아름다움이 빼어나 그 정취를 맛보려는 이들이 워낙 많은 탓에, 보존을 위해 공개하지 않은 지도 꽤 됐다.
그것이 얼마 전에 풀리기는 했지만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만 다닐 수 있었다. 그 날의 관람은 특히 전각을 돌보는 쪽보다는, 궁의 내의원 동쪽 담장을 끼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난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펼쳐지는 후원 관람이 주였다.
부용지를 중심으로 그 못에 두 다리를 담그고 서 있는 정자인 부용정과 주합루와 영화당을 돌아보고, 애련지와 애련정을 지나 다시 승재정과 존덕정을 거쳤다. 후원의 그 많은 정자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인조 때부터였다는데, 정의정 앞쪽 암반에 샘을 파고 물길을 돌려 폭포를 만든 곳에 옥류천이라고 새겨져 있다.
궁 안에 이렇게 깊은 정원을 꾸며 놓았으니, 이곳에 머문 비빈들이 굳이 궁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사계절의 정취를 다 느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내심 부럽기까지 했다. 그 마음을 안고, 순조 때 왕세자였던 익종의 청으로 아흔아홉 칸인 사대부집을 모방해 지었다는 연경당을 돌아봤다.
그리고서 궁의 옆문인 금호문을 향해 담을 끼고 걸어 나올 무렵이었다. 그 길가에서 사월 끝자락의 햇빛을 안고 피어있는 황매화를 만나게 될 줄이야. 아니, 후원으로 향하는 문을 들어서기 전 낙선재 입구에서 난 벌써 그 꽃나무와 마주쳤었다. 그 재(齋)에 발을 들여놓는 여인들의 심정을 다섯 장 노란 꽃잎에 담아내기라도 하듯, 가지가 휘도록 피어있는 황매화 한 그루가 마음을 줄곧 뒤로 끌어당긴 것도 사실이었다.
창덕궁에서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궁궐지>에 창경궁에 속한다고 되어있는 낙선재는 깊은 슬픔을 안은 궁의 여인들이 기거하다 간 곳이다. 헌종이 즉위한 지 십삼 년 되던 해에 지어졌다는 -궁의 화려함보다는 여염집의 조촐함이 더 배어있는- 그 집은 원래 총애한 여인을 위한 곳이었다고 한다.
임금이 되고서야 혼례를 올린 그분은 왕비로 뽑힌 여인보다는 간택에서 떨어진 한 여인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창덕궁에 있는 왕비전에서 떨어진 창경궁에, 그러면서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처소를 마련해 머물게 했다. 그 후에는 국상을 당한 왕비와 후궁들을 기거하게 했다는데, 그 바깥 쪽 뜰에 관을 발인할 때까지 두었던 빈전(殯殿)으로 보이는 사각정이 남아있다.
몇 년 전 조경하는 사람들 모임에 끼어 낙선재 일곽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석복헌과 수강재와 취운정과 한정당 등을 대하는 동안, 순종이 승하하자 그곳에서 여생을 보낸 윤비와 영친왕이 타계한 후 역시 그곳에 머물다 떠난 이방자 여사의 슬픔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일본에 끌려갔다 돌아온 덕혜옹주도 끝내는 거기서 세상을 등졌으니, 낙선재야말로 왕실 여인들의 비운한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일 게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피어있는 황매화의 한 종류인 죽도화는 노란 겹꽃을 수없이 피워 늦봄을 밝히는 꽃이지만 애석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왕이 승하한 후, 혼자 남겨진 왕의 여인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할 운명을 안고 들어서는 낙선재의 문 앞에서 그녀들이 흘렸을 눈물이 황매화로 피어난 것은 아닐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 꽃에 담겨 있는 전설 또한 애달프다. 한 왕이 주위를 물리치고 사냥을 나갔다가 비를 만났는데 마침 산기슭에 허름한 집이 있어 찾아갔다. 한 여인이 나오기에 비를 가릴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얻자 했더니, 아무 말없이 마당에 핀 황매화 한 가지를 꺾어 주고는 돌아섰다.
황매화는 꽃이 많이 피나 열매가 없으므로, 비를 가릴 수 있게 드릴 만한 것이 없어 안타깝다는 뜻이었다. 그건 어쩌면 건넬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뜻도 될 테니, 지아비인 왕을 잃은 여인들의 심경을 대신 한다 여겨도 되지 않을까. 봄의 끝자락에 찾아간 궁에서 꽃처럼 화사한 여인들의 자태대신 홀로 남겨진 비빈들의 처연함을 느끼고 돌아오자니, 내 봄의 뜨락에까지 황매화가 피어난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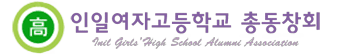




백일장에서 항상 장원이란 호칭이 따라 다녔던 너
저런 글은 어떻게 나올까 부럽기도 했었다
언젠가는 큰 작가가 되어 우리들 앞에 "짠"하고 나타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황연희에게 꽃자료를 부탁하는 글을보고 어떤 멋진 글이 나올까 기다렸는데
역시 대단하다.
황매화는 나도 오래전 어느 봄 날 낙선재에서 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 흔한 꽃으로 별 흥미없이 보았건만 ..역시 작가는 틀리구나
멋진 글 종종 부탁한다.
트럼펫 수선화도, 피뿌리풀꽃 터도 잘 읽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