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회 | 포토갤러리 | - 게시판담당 : 박화림
 |
경선아~
내 동생이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언니 고목나무에 물 오를껄?" 하더라.
그런데 섹스 장면에도 별 동요가 없는 내 자신이 이제 정말 여자로서 끝난거구나 그런생각까지 들었어.
암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인생에 대해 다시 곱씹어보게 하는 영화였어.
문맹이란 것이 알려지는 것이 무거운 형랑과 바꿀만큼 그렇게 수치스런 것이었을까?
그리고 성장과정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것 같아.
그래서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
어떤 책에서 본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란 귀절이 생각난다.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자신을 녹이고 싶을 만큼 몰입된 사랑은 아름다운것 같아.
그녀를 보내고서야 딸에게 과거를 얘기하면서 딸과의 관계를 복구하려는 마지막 장면이 나도 좋았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것 같아.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가 "타이타닉"보다 훨씬 원숙해지고 얼굴도 지적으로 성숙해졌더라.
경선아~
영화가 있어서 행복하지?
조근조근 영화얘기 나누는 모습들이 아름답네.
난 영화를 별로 안좋아하는걸 보니
문화인이 못되나봐.
옛날 어렸을적 본 영화들만 생각나고
어른이 되어선 본기억이 없어.
무식이 탄로 날까봐 기냥 눈팅만 하려다가
그래도 내친구들이 속닥대는데 모르는 척 할수가 없어서리.....
니들 영화얘기에 대리 만족이나 느껴야겠다.
영화 시작 1분 전까지 나 혼자인거야.
너무 으시시 해져 혼자봐야 하나 갈등하며 마음이 분주해지는 찰라 두 사람이 들어 오더라.
지옥에서 뭐 만나듯 너무 반가워 `어서 오세요` 멘트가 절로 나가더군 ㅎㅎㅎ
인사 잘해서 그들에게 프렌치프라이도 얻어먹으면서 셋이서 널널이 앉아 영화감상 잘했지 뭐니.
나중에 보니 모녀드라.
80세 쯤 되보이는 어머니가 꽤 멋있어 보이드라
그러니 순호 너도 80에 딸과 영화관 가려면 보는 훈련해 두는 것도....그들 모녀가 다정해 보이고 참 좋던걸.
"The Reader"
흥미로운 영화 같다.
나도 빌려다 봐야 겠구나.
모두 잘 있지?
여기 뉴욕 날씨, 오락가락 하네.
지금은 뿌연 거 같애.
새벽 6시면 집 수리할 재료상 문을 연다해서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만 홈피 여기저기서 나오는 음악에 흘려
시간 흘려보내고.
곧 나가서 장 다보고 와야겠다.
그래야 내일 부활절 식사 준비도 마련하고,
잔디 깍는 기계도 사와야 겠고.
모처럼의 연휴가 벌써 반이 흘러갔네.
아주 아주 무디한 음악을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길어다 놨는데
미국에서는 안들린다는 얘기도 있고....정례가 홀린 음악에는 이곡이 속하니?
수인이가 꼭 들었으면 하는데....
벚꽃잎 흩날리는 벚나무 아래서 차 한잔 마시며 들으면 꼭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인데![]()
정례야 ~
오랫만이야.
성실하게 사는 네 모습 그려진다.
경선이 음악 선곡 너무 잘하지?
경선아~
벚꽃 하면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랑 이영애가 마주 앉은 창가에 화면 가득 화사한 분홍빛 벚꽃이 가득한 장면 생각나고
또 오정혜 나오는 임권택 영화 어머~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나네.
정말 나이 먹었나봐.
노인의 임종을 맞을때 창호문밖으로 벚꽃이 꽃비를 날리며 떨어지는 장면, 너무 아름다워 전율이 느껴졌어.
그 장면들 생각나지?
순호야~
너는 영화 안봐도 돼.
김순호 주연으로 전국을 누비고 영화 찍고 다니잖아~ㅎㅎ
경선아,
음악 선률이 기막히게 가슴을 치네.
특히 오늘같이 이슬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엔...
내일 부활절 잔치상
비빔밥에 갈비, 햄구이를 생각해서 재료를 사왓지
동서 음식 혼합이 너무 우스울 것 같다만
고기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좀 많거던.
오랫동안 해보질 않아서 좀 겁이 난다.
집 앞과 뒷뜰이 작아서 손수 할 것 같아
잔디 깍는 기계 한달 안에 반납해도 된다해서 마음놓고 가져왔다.
힘에 부치면 사람 쓰면 되니까.
화림아,
잘 있지?
그래 경선의 예술 감각은 탁월해.
이 음악 들으니 왜 이리도 너희들 모두 보고 싶니?
악기 조화가 참 묘해서인가?
순호야,
남한 반도 안가본데 없겠구나.
여행은 참 좋은 거 같애
나처럼 사무실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 보다 훨씬 시원하게 인생을 배우게 되잖니.
나도 시간나면 유람다니고 싶어. 특히 우리나라 남쪽.
명옥아,
네 피아노 소리도 듣고 싶구
그냥 음성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당당히 "ich liebe dich 를 부르던 모습이 생각난다.
나도 속으로 반주라도 해줄껄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부끄럼을 많이 탔던지 말이야.
그 때부터 정례는 역시 달랐어.
다음에 오면 전화라도 하자.
경선아.
한시 또 안올려줘?
명옥아,
순복이 약혼 날 노래 부른 기억은 없으나
했을 가능성은 있어. 순복이랑 단짝이었으니까.
그 노래 그 당시 무척이나 좋아했었거던..
발음도 신통치 않았을터인데 원어로 부른답시고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습다.
그래도 부를 용기는
박영애 독일어 (중학교 땐 영어 가르치셨지) 선생님과
콩나물로 음정을 제대로 낼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음악 선생님 덕일거야.
미국올 때 짐 속에 우리나라 가곡집 한권과
서양 명곡집 한권을 넣어 왔는데...
노동과 학생 신분으로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다가
어디서 분실되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일년에 한번 정도 가는 노래방에서
실은 가곡/명곡 불러보고 싶지만 분위기 망치긴 싫구
이젠 변질된 음색과 고음 처리도 안되다보니
듣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야.
이곳 홈피에서 들려주는 음악 하나 하나가
가슴으로 직접 파고 드는 건
신경을 곤두 세어야 들리고 이해되는 영어와는 달리
쏙쏙 들어오는 우리 말과 문자랑 어울려서일거야.
얼마나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드는지 몰라..
명옥아!
우리 한번 꼭 만나자.
그 때 네 피아노 소리 들으면 또 다른 깊은 감회에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따스해지네.
나 연습 안하면 슬퍼 할 사람들 많아져서 큰일이네
아라쪄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연습 또 연습하겠어요.(나의 다짐)
예들아,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있다.
니네들 서순석 국어 선생님 기억나니?
방금 전화 통화했어.
이곳 뉴욕 후러싱 쪽에 산다는 인일 후배로 부터 번호 받고 얼른 했는데
날 몰라뵈도 고맙다고 인사드릴려고 했는데
함씨 성이 휘귀해서 이름을 기억하신데.
어쩜, 한시간 이상,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꼭 친구처럼 예기 많이 나누었어.
어찌 그처럼 간격없이 시간 가는줄 모르고 예기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음성은 그대로 고우시고,
78세 되신다는데 예전처럼 예쁘신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구나.
강순옥 선생님, 김재옥 선생님, 또 가사 선생님이신데 이름 까먹었네, 그렇게 참 친하게 지내셨데.
지금 뉴욕 후러싱쪽에 부군과 사신다고 하시네.
찾아뵐 스승이 있다는게 참 좋구나..
도중에 오셨다고 은희언니에게 들은 것 같은데......
연극도 잘하시고 희로애락이 확실하게 느껴지던 무척이나 귀여운(이래도 되나?) 분이셨어.
반가우셨겠다... 자랑스럽기도 하셨을테고.
영화 <The Reader>에서 소재가 달리 흘러가게 만들어 미안하네.
서순석 선생님의 부군이 이곳서 공부 마치시고 가르치시다가
한국에서 오라고 하셔서 수원에 있는 대학 (또 이름 잊어버렸네)에서 가르치시다 은퇴하셨다네.
뉴욕으로 함께 오신지는 2년 반 정도 되셨데.
아드님(뉴저지), 따님 (워싱턴 D.C) 가족이 있다고 하셨어.
만나뵈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단다.
경선아,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셨고, 나중에 부군과 함께 하시려고 한국에 나가 계시다가 오셨다고 하셨거던. 그러니 네 말이 맞지. 내가 글을 급히 올리느라고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 같다. 미안.
어제 선희자가 홈피를 보고 전화를 해서 번호를 알려주었으니까 선생님과 통화했을거야.
경선, 수인, 희자 삼인방에
한쪽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가 심심하다고
건강 등 형편이 빨리 낳아지길 바란다고 했어.
희자야,
기다릴께.
명옥아
자정이 되어 오는데
1시간 정도 전화 회의를 마치다보니
잠이 달아나 버렸어.
하두 이 음악이 좋아서 틀어놓고 잘려고 하다가
몇자 적는다.
서순석 선생님과 함께 모임이
5월 2일 (토) 낮으로 결정되었다고 후배로 부터 받았어.
뉴욕 근처에서 사는 동기들에게도 다 연락이 가고 잇으니까
많이 모일 것 같네.
2시간 전에 김정자 (인천 여중 같이(이 자기도 연락받았다고
같이 가자고 했지.
서 선생님
네 말대로 참 고우셨지.
그러고 보니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이제 이곳 뉴욕지구 인일/인천여중 동문 모임이 자주 있게 될 가능성이 이번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혜련아, 희자야,
후로리다에 내려간 혜련아
올라올 수 있겠니?
희자도 오면 참 좋을텐데. 기차타고 오면, 후러싱으로 가는 교통은 내가 마련할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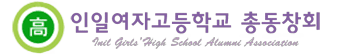




벌써 어렴풋한 기억, 느낌 만 남았는데
네가 리뷰한 글로
다시 영화를 본 느낌이다.
마지막, 그녀에게 베푼 그의 마음 씀과
딸과 함께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이 감동이었어.
나는 벌써 '니나'도 잊어버렸어.
까먹기의 천재가 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