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에는 작년에 처음 가 봤다.
요즘은 골골이 찻길이 만들어져 있어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실은 아주 깊은 골짜기라고 했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답답하고 고단한 생활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밀리듯 살다가 좋지 않은 병에 걸렸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회복되었다.
그 이후 그 선생님은 남편과 시간만 되면 여행을 다니곤 했다.
어느 여행길, 봉화를 지나다가 산세와 물길이 하도 좋아서 그 자리에 서서 그만 그 근처에 땅을 구했다고 했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내려가서 집을 짓기 3년.
사과 꽃이 피던 작년 5월 동료 선생들과 그곳을 다녀왔다.
마을도 뚝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도 물론 없었다. '휴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여행이었다.
그곳 봉화에서 이 영화는 시작된다.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3년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소와 함께 지내면서 조용히, 느리게 이 영화를 찍었다.
이 영화는 시속 2Km다. 영화를 보면 안다.
가상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영화도 재미있지만 난 다큐멘터리가 좋다.
특별한 배우고 없고,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는 만들 수 없는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닿는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삶이 직접 그대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의 근본 축은 일흔 아홉의 최 할아버지와 마흔 살이 된 ‘소새끼’의 사랑이다.
소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성치 않다. 잘 걷지를 못하고 한쪽 다리를 전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논에서나 밭에서나 엎드려서 기어가듯이 일을 한다.
그런 할아버지의 몸놀림과 늙고 병든 소는 아주 잘 어울린다.
“어떤 여자는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남편이 농약도 척척 뿌려주고.... 어휴, 저놈의 소새끼만 아니믄....” 하는 할머니의 푸념을 뒤로 하고 소에게 줄 풀을 뜯기 위해 농약도 안 치고,
“아, 기계로 하면 척척 모도 심어지건만, 나만 고생시키고..... 저래 하면 을매나 좋노....” 하는 할머니의 불평에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게 좋지, 구석 구석...... 기계가 뭐 아나?”
“아, 사료 줘야지 뭘 꼴을 베서 쇠죽을! 아휴, 이 뭔 고생이람, 그저 할아버지 눈에는 저놈의 소새끼만 보여요.......!!”
할아버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소를 노려보는 할머니의 눈은 시앗을 보는 눈과 닮아 있다.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웃음이 가시지 않는다.
할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지 그렇게 일 좋아하는 할아버지 옆에서 살아온 할머니 또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까?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일을 한다. 할아버지에게 일은 숨 쉬는 것과 같다.
머리가 아파서 “아파, 아파....” 하면서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논으로 밭으로 간다.
그 곁엔 항상 소가 있다.
뒤에서 그런 모습을 노려보는 할머니.
소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일을 많이 해서 무릎이 거의 썩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잘 일어서지를 못한다. 소가 일어설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렇게 힘들게 일어선 소는 또한 그렇듯 뚜벅뚜벅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할아버지를 싣고 갈 곳을 간다. 논밭은 물론 시내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할아버지의 몸은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있다.
시간이야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무슨 상관이랴.
소는 할아버지를 움직여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모두 할아버지 몫이다. 일하는 것도 나무 베는 것도 풀 베는 것도.
너무 늙고 힘들어서 짐을 좀 옮기면 입에서 거품이 난다. 그걸 안쓰럽게 바라보는 할아버지.
그럴 땐 할머니도 말한다. “에구 니가 힘들구나......”
할아버지도 너무 아프고 할머니의 잔소리도 심하고,(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마음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소를 팔러 나간다.
평생 소를 미워하고 질투하던 할머니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소를 만진다.
하지만 40년 된 소를 누가 사겠는가?
“할아버지 이거 질겨서 씹지도 못해요.” “120만원 드릴게.”
농조로 얘기를 하는 우시장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500만원 이하는 안돼!”
우시장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며 소를 끌고 나오는 할아버지.
시장 근처 식당에서 맛나게 소주 몇 잔을 드시며 할아버지는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말한다.
“한번은 내가 술이 취해서 정신을 놓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글쎄 딱 우리집이더라구. 하하하”
마치 장한 자식 자랑하는 것 같던 할아버지의 모습.
그 말이 그 영화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고 오래 한 할아버지의 말이다.
하지만 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이제는 가야 한다.
소가 일어서지를 못하자 몇 번 소를 일으켜 세우려 애를 쓰던 할아버지는 크게 소리친다.
“에이 씨! 에이 씨!”
절망과 슬픔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픈 것이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수의사의 통고를 받고 할아버지는 소의 코뚜레와 워낭을 잘라 풀어준다. 코뚜레와 워낭은 그 진하고 깊은 할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툭 끊어진다.
눈물을 주루루 흘리고 고요히 눈을 감는 소에게 할아버지가 급히 소리친다.
“좋은 데 태어나거라.”
땅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땅을 파서 사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세상.
시골의 사계절을 단정히 찍어 자연과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담담하게 엮어낸 연출의 힘이 돋보인 훌륭한 작품임에도 보고 나오는 내 마음 착잡하기 그지 없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영화.
안구 테두리가 뻑뻑하니 눈 알을 0.1mm만 움직여도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아
뚫어져라 모니터만 봤다.
옥규의 글 만으로도 이런데, 영화로 봤다면 어땠을까?
송선배님은 어느새 찾아 보셨나보다.
나도 찾아 봤더니 이런 네티즌의 평도 있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제목: 아 너무 쪽팔렸다 진짜
영화관 알바하는 친구가 영화보여준다길래 친구한명이랑 먼길 갔더니
워낭소리 주길래 이자식이 우릴 엿먹일라 하는구나 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뒤에서 한 중년부부께서 요즘 젊은것들은 겉모습만 따진다며 우리를 혼내셨다;
그래서 결국 잠이나 자자며 뒷자리에 앉았는데 아까 우리를 혼내시던 아줌마 아저씨께서
우리 옆에 앉으셨다ㅡㅡ 이건 뭐 잘수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나올때는 눈물 콧물 다뽑았다.
차갑게 굳은 가슴에서 짠 눈물이 한방울 세어나오면서 부터 시작해
결국 홍수가 터져버렸다.........
아저씨랑 눈마주치면서 무지 쪽팔렸지만 부커티 닮은 내친구가 앞좌석 붙잡고 그만을 외치며 울었기에
그나마 위안이 됬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소의 관계에서
묻어나는 더 깊은 정.
와 진짜 영화에서 향기가 나긴 첨이였다ㅠㅠ
할아버지가 요즘 사람보다 말 못하는 소가 낫다는 말은
지 살길바쁘게 사는 우리에겐 너무 와닿는 말이였음.
ㅡ
영화관을 나오면서 눈이 붉게 충혈된 우리를 보며 알바하는 친구색히가 사진찍으며 실실쪼개길래
로우킥을 허벅지가 아닌 그색히 생식기에 날리고 싶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꾸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리속을 맴돌았다.
" 좋은곳으로 가그레이. "
뻔한 스토리,
다큐멘터리도 영화관에서?
이곳저곳 감상기 읽어내다 눈물이 줄줄 ~
이충렬감독의 눈길 나도 함께하고 싶어져...
오, 예,
우리 동네에서도 하네.
안방 좋아하는 내짝도 한번 울려봐?
옥규야,
적절한 때에 유익한 글 고맙다. 명절 잘 지내.
곱고 순수해보이시는 미선언니도 명절에 행복한 시간 보내셔요.
네 글도 글이지만 우리 딸 강추,
그리고 울고 싶은데 울 곳이 없어 그 영화보며 계속 울었다는 동네 친구가
또 보자고 불러내 나도 울어봐? 하며 본 영화!
근데 그 전날 애들 아빠랑 본 적벽대전2도 그렇고
그 전날 밤중에 본 콜드마운틴도 그렇고...
사랑을 꿈꾸고 인간애를 간직하려는 몸부림...
콜드마운틴 대사 중
"말이 오가야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느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밤새 누군가를 그리느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다 저리면
그 기분을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하죠?"
내내 생각나
한편 맘 싸아 하고 한편 맘 든든한 날이다.
오늘 본 시
삼학년
박성우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를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거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귀를 첨으로 맞았다
개건너로 소풍간 날
우물가에 앉아
코스모스 꽃을 동동 띄웠네
물동이 이고 온 아주머니
불벼락 떨어지고
놀라 달아나던 논두렁 길
눈 껌벅이며 앉은 누렁 소
내 눈엔 뿔만 보여
엉거주춤 뒷덜미 잡혀
내내 눈물바람에
우물 속
코스모스 꽃잎 떠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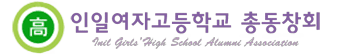





감동의 도가니!!~~~
사람이 이리도 아름다움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겠지!~~~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