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참고문헌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권》, 1998, 시공사. (펌)
1.초창기의 순정만화 (1950-60년대)
1956년 김정파에 의해 그림소설식 만화 <흰구름 가는 곳>이 발표되면서 우리 순정 만화는 그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김정파의 만화는 그림이야기처럼 완전한 만화의 형태가 아니어서 오늘날의 순정만화 효시라기보다는, 과도기적 단계의 최초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김정파 이후, 1957년 4월에는 완전한 형태의 순정 만화 <영원한 종>이 한성학에 의해 창작, 발표돼 소녀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성학의 뒤를 이어 곧바로 등장한 권영섭(1939년 대구 출생)은 1960년대 초반 청순가련형의 소녀 '봉선이'를 등장시킨 일련의 소녀 만화를 발표해 순정 만화 영역을 확실히 다져나갔다. 권영섭은 <오손이 도손이>(1960.1. 출간), <은색의 십자가>를 비롯 <울밑에선 봉선이>, <봉선이하고 바둑이>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 이범기(1939년 서울 출생)는 1960년대 초반 <장희빈>, <강화도련님>, <단종애사> 같은 역사 소재의 순정만화로 인기를 얻었고 김용도(1941년 서울 출생)는 <인어공주>,<세공주>,<비엔나> 등 전형적인 여성 취향의 그림체로 1960년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던 남성만화작가로 꼽힌다.
* 박수산(1940년 경기 출생)은 1960년대 정상의 인기를 확보했던 순정만화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단국대 법대 재학 중 꾸준하게 순정만화를 발표해왔고, 남성작가이면서도 섬세한 여성 심리의 표현에 탁월, 페미니즘 작가로 분류해도 좋을만한 작품들도 다수 남겼다.
* 조원기(1942년 서울 출생)도 깔끔한 그림의 순정만화체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
* 부호(본명 김성,1938년 서울 출생)를 비롯 <나미와 유령건반>의 조애리(본명,1943년 경남 출생)등도 여성 이름의 남성 작가로 당대 순정 만화계의 맥을 이었던 작가였다.
* 여성 순정 만화작가로 원로격인 송순히(본명,1939년 한남 출생)는 <재생>, <생명> 등 묵직한 주제의 순정만화를 잇달아 발표, 소녀층보다는 성인여성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장은주(본명 장영자 張英子, 1941 경남 출생)는 <철없는 약속>으로,
* 민애니(본명,1945년 서울 출생)는 <인어언니>로 우리 순정만화를 확고한 위치로 올려놓은 여성작가였다.
*이성희(1948년 충북 출생),이미라(1951년 부산 출생) 등이 이들의 뒤를 잇는 여성 순정만화 작가 계보를 형성했다.
* 이미라는 하반신 불수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독학으로 만화계에 데뷔, 인기작가가 됐고 지금까지 작품을 꾸준히 창작하고 있는 만화계의 인간승리로 꼽히고 있는 작가다.
* 최진희(본명,1952년 부산 추생)의 <수선화>, <뷔엔나 숲의 이야기>도 그 무렵 소녀들이 인기를 얻었던 순정만화였다.
2.엄희자의 전성기(1960-70년대)
1960년대 우리 순정만화를 대표했던 작가로 엄희자(1942년 서울 출생)가 꼽힌다. 엄희자는 우리나라 초창기 순정만화의 그림체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1960년대-1970년대 초반 발표작품의 수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당시 이 분야 최고작가로 군림했다. 깔끔한 터치와 군더더기 없는 인물 묘사로 1970년대에는 외국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완벽하게 만화로 소화해 내는 등,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발휘했다.
엄희자의 대표작으로는 <무명저고리>, <네 자매>, <유리인형>, <잃어버린 날>, <코코> 등이 있다. 엄희자의 문하생 출신인 차성진은 엄희자 이후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우리 순정만화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3.은둔의 시기, 일본 만화의 해적판, 아류 시기 (1970년대 중반 이후)
엄희자의 전성기 이후 우리 순정만화는 일단 자취를 감추는 은둔의 시기를 맞았다. 만화의 유통이 만화방에 의해 독점되고, 이에 따라 만화방을 독차지한 소년 고객들의 등쌀에 우리 소녀층들이 만화방 출입을 기피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순정만화의 암흑기에도 불구, 여학생 잡지 등에 <상급생> 같은 순정만화를 꾸준히 연재했던 작가도 있었다. 작가 이혜숙의 만화는 일본만화를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아 독창적 작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꾸준한 창작으로 우리 순정만화의 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는다.
순정만화의 재등장의 기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만화 <캔디 캔디>가 우리 소녀층의 인기를 끌면서 갑자기 찾아왔다. <올훼스의 창>, <베르사이유의 장미>, <롯데롯데>, <안제리크>, <유리가면>, <유리의 성> 등 전형적인 일본 소녀만화가 앞서 소개된 <캔디 캔디>의 성공에 힘입어 잇달아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가라시 유미코, <캔디캔디> ,
이가라시 유미코, <캔디캔디> , 아케다 리요코, <베르사이유의 장미>
아케다 리요코, <베르사이유의 장미> 스즈에 미우치, <유리가면>
스즈에 미우치, <유리가면>  <비련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아케다 리요코의<올훼스의 창>
<비련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아케다 리요코의<올훼스의 창>
이 작품들은 거의가 국내작가들의 창작품인 양 위장된 채 버젓이 작가의 이름까지 표지에 내세우고 시중에 팔렸던, 소위 해적판 만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영숙, 김영숙, 황수진 등이 이 시기 해적판 순정만화 표지에 단골로 등장했던 작가들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건너온 순정만화들이 표절시비에도 불구,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자 아예 이 그림체나 줄거리를 그대로 모방해 새로운 창작을 했던 소위 일본 아류의 순정만화가 국내 작가들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후반 우리 만화계에서는 거의 비슷한 그림체에다 비슷한 내용으로 일관된 갖가지 순정만화가 작가의 이름만 달리한 채 양산되는 진기한 현상을 겪기도 했다.
1.초창기의 순정만화 (1950-60년대)
1956년 김정파에 의해 그림소설식 만화 <흰구름 가는 곳>이 발표되면서 우리 순정 만화는 그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김정파의 만화는 그림이야기처럼 완전한 만화의 형태가 아니어서 오늘날의 순정만화 효시라기보다는, 과도기적 단계의 최초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김정파 이후, 1957년 4월에는 완전한 형태의 순정 만화 <영원한 종>이 한성학에 의해 창작, 발표돼 소녀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성학의 뒤를 이어 곧바로 등장한 권영섭(1939년 대구 출생)은 1960년대 초반 청순가련형의 소녀 '봉선이'를 등장시킨 일련의 소녀 만화를 발표해 순정 만화 영역을 확실히 다져나갔다. 권영섭은 <오손이 도손이>(1960.1. 출간), <은색의 십자가>를 비롯 <울밑에선 봉선이>, <봉선이하고 바둑이>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 이범기(1939년 서울 출생)는 1960년대 초반 <장희빈>, <강화도련님>, <단종애사> 같은 역사 소재의 순정만화로 인기를 얻었고 김용도(1941년 서울 출생)는 <인어공주>,<세공주>,<비엔나> 등 전형적인 여성 취향의 그림체로 1960년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던 남성만화작가로 꼽힌다.
* 박수산(1940년 경기 출생)은 1960년대 정상의 인기를 확보했던 순정만화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단국대 법대 재학 중 꾸준하게 순정만화를 발표해왔고, 남성작가이면서도 섬세한 여성 심리의 표현에 탁월, 페미니즘 작가로 분류해도 좋을만한 작품들도 다수 남겼다.
* 조원기(1942년 서울 출생)도 깔끔한 그림의 순정만화체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
* 부호(본명 김성,1938년 서울 출생)를 비롯 <나미와 유령건반>의 조애리(본명,1943년 경남 출생)등도 여성 이름의 남성 작가로 당대 순정 만화계의 맥을 이었던 작가였다.
* 여성 순정 만화작가로 원로격인 송순히(본명,1939년 한남 출생)는 <재생>, <생명> 등 묵직한 주제의 순정만화를 잇달아 발표, 소녀층보다는 성인여성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장은주(본명 장영자 張英子, 1941 경남 출생)는 <철없는 약속>으로,
* 민애니(본명,1945년 서울 출생)는 <인어언니>로 우리 순정만화를 확고한 위치로 올려놓은 여성작가였다.
*이성희(1948년 충북 출생),이미라(1951년 부산 출생) 등이 이들의 뒤를 잇는 여성 순정만화 작가 계보를 형성했다.
* 이미라는 하반신 불수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독학으로 만화계에 데뷔, 인기작가가 됐고 지금까지 작품을 꾸준히 창작하고 있는 만화계의 인간승리로 꼽히고 있는 작가다.
* 최진희(본명,1952년 부산 추생)의 <수선화>, <뷔엔나 숲의 이야기>도 그 무렵 소녀들이 인기를 얻었던 순정만화였다.
2.엄희자의 전성기(1960-70년대)

1960년대 우리 순정만화를 대표했던 작가로 엄희자(1942년 서울 출생)가 꼽힌다. 엄희자는 우리나라 초창기 순정만화의 그림체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1960년대-1970년대 초반 발표작품의 수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당시 이 분야 최고작가로 군림했다. 깔끔한 터치와 군더더기 없는 인물 묘사로 1970년대에는 외국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완벽하게 만화로 소화해 내는 등,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발휘했다.
엄희자의 대표작으로는 <무명저고리>, <네 자매>, <유리인형>, <잃어버린 날>, <코코> 등이 있다. 엄희자의 문하생 출신인 차성진은 엄희자 이후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우리 순정만화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3.은둔의 시기, 일본 만화의 해적판, 아류 시기 (1970년대 중반 이후)
엄희자의 전성기 이후 우리 순정만화는 일단 자취를 감추는 은둔의 시기를 맞았다. 만화의 유통이 만화방에 의해 독점되고, 이에 따라 만화방을 독차지한 소년 고객들의 등쌀에 우리 소녀층들이 만화방 출입을 기피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순정만화의 암흑기에도 불구, 여학생 잡지 등에 <상급생> 같은 순정만화를 꾸준히 연재했던 작가도 있었다. 작가 이혜숙의 만화는 일본만화를 그대로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아 독창적 작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꾸준한 창작으로 우리 순정만화의 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는다.
순정만화의 재등장의 기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만화 <캔디 캔디>가 우리 소녀층의 인기를 끌면서 갑자기 찾아왔다. <올훼스의 창>, <베르사이유의 장미>, <롯데롯데>, <안제리크>, <유리가면>, <유리의 성> 등 전형적인 일본 소녀만화가 앞서 소개된 <캔디 캔디>의 성공에 힘입어 잇달아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가라시 유미코, <캔디캔디> ,
이가라시 유미코, <캔디캔디> , 아케다 리요코, <베르사이유의 장미>
아케다 리요코, <베르사이유의 장미> 스즈에 미우치, <유리가면>
스즈에 미우치, <유리가면>  <비련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아케다 리요코의<올훼스의 창>
<비련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아케다 리요코의<올훼스의 창>이 작품들은 거의가 국내작가들의 창작품인 양 위장된 채 버젓이 작가의 이름까지 표지에 내세우고 시중에 팔렸던, 소위 해적판 만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영숙, 김영숙, 황수진 등이 이 시기 해적판 순정만화 표지에 단골로 등장했던 작가들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건너온 순정만화들이 표절시비에도 불구,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자 아예 이 그림체나 줄거리를 그대로 모방해 새로운 창작을 했던 소위 일본 아류의 순정만화가 국내 작가들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후반 우리 만화계에서는 거의 비슷한 그림체에다 비슷한 내용으로 일관된 갖가지 순정만화가 작가의 이름만 달리한 채 양산되는 진기한 현상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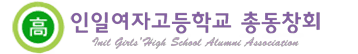




남장 여인 '오스칼'님이 나오는 '베르사이유의 장미'에 나는 푹 빠진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