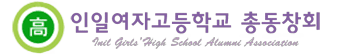3회 | 포토갤러리 | - 게시판담당 : 한선민
글 수 2,982
안마도의 4월풍경을 올립니다.
여의도, 진해, 인천자유공원, 백수해안도로등의 벗꽃도 좋지만
안마교회의 한그루의 그것도 괜찮답니다.
곧 5월,
다시는 돌아오지않는 2008년의 안마도의 사월 .......
2008.04.14 16:37:27 (*.172.108.5)
* 전직 PD인 박교수란분이 “봄날은 간다”에대해 감칠맛나게 쓰셨네요...
내용이 다소 긴듯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봄날은 간다>
봄이 왔다.
강화의 매서운 바람을 용케 견뎌낸 목련가지에 꽃망울이 수줍게 솟아 있다.
서울보다 1주일은 늦으니 아직도 보름이나 지나야 터뜨릴 것이다.
대지에는 이미 들풀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고 있고 산수유는 노랗게 꽃을 피웠다.
관수재 주변의 땅은 한 삽 파면 절반 이상이 돌덩이다.
풀 한 포기 심으려고 해도 땅파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나무를 심는 일은 뿌듯하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무슨 엄청나게 기대할 미래가 있을까마는 그래도 나무를 심는 것은 기분 좋은 노동이다.
어찌 어찌 나무를 다 심고 나니 벌써 한 낮이다. 아침도 거른 탓인지 몹시 허기가 진다.
라면 물을 불에 올려놓고 LP 한 장을 걸었다.
만토바니 악단의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 판에서 ‘봄의 소리’에 바늘을 맞췄다.
아직 한기가 있는 관수재 거실에서 진공관식 앰프의 빨간 시그널이 따뜻함을 준다.
나는 어렸을 적에 ‘나의 살던 고향’을 즐겨 불렀다.
특히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이라는 가사를 좋아했다.
어린 탓에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이름에서 오는 꿈같은 화사함을 좋아했다.
대학 때는 “록키산의 봄”이라는 노래를 좋아했다.
당시에는 팝송이 유행하던 때였다.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y. I'll be coming back to you” 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가보지도 못한, 록키산에서 펼쳐지는 로맨틱한 사랑을 그저 상상하며 즐겨 불렀다.
비발디의 ‘사계’ 중 1악장 ‘봄’과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봄의 소리’도 빼 놓을 수 없다.
‘봄의 소리’왈츠는 처음 들어가는 도입부부터 아주 경쾌하게 시작된다.
짠! 짜자잔 짜자잔, 짠 찬 찬~ 하고 시작되는 인트로는 마치 춥고 음산했던 겨울의 장막을
한 순간 거침없이 치고 나오는 듯한 봄의 생동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는 아주 엉뚱하다.
엉뚱하다는 것은 소위 뽕짝이라고 부르는 트로트를 별로 즐기지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을 노래한 하구 많은 트로트 중에서 하필 ‘봄날은 간다.’일까?
이 노래는 박시춘 씨가 손로원 선생의 가사에 곡을 붙였는데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아주 일품이기 때문이다.
노랫말 처음부터 들어보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 날리더라”
분홍빛이 어떤 색깔인가?
영어로는 pink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pink보다는 분홍이 훨씬 감미롭고 가슴에 젖는다.
그냥 분홍도 아니고 연분홍이다.
연분홍!... 듣는 이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 색깔이 아닌가? 말해 무엇 하랴.
싱그러운 여인의 몸을 휘감은 연분홍빛 치마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에 휘날린단다.
그것도 봄바람에... 얼마나 가슴 설레고 볼이 달아오르는 표현인가?
이쯤이면 화사한 봄날에 들뜬 젊은이들의 춘흥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노래를 들어보면 화사하기 보다는 차라리 애절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 무슨 조화인가?
조금 더 들어보자.
“미미미 라라시 도도시라♬” 단음계로 나가는 폼이 심상치 않으니 말이다.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 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옷고름을 씹는다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하기 사 옷고름이 무언지 조차 모르는 젊은이도 많을 테니...
오직 지아비에 대한 순종과 인종이 여인의 덕목이던 시절, 기쁠 때나 반가울 때,
서러울 때나 분노가 치밀 때 여인들은 그저 애매한 표정으로 옷고름을 씹을 뿐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슴속으로 질끈질끈 씹어 삼키는 것이다.
성황당 길도 실로 의미심장하다.
성황당 길은 원래 인적이 드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요즘처럼 자유분방한 연애는 생각도 못하던 그 시절,
처녀 총각이 남모르게 밀회를 즐기기에 이처럼 적당한 곳이 없었으리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울고 웃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던,
인적이 드문 성황당 길에서 (기껏) 손을 꼭 잡고 사랑을 맹세 하던,
그 사내는 무정하게도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요즘 같으면 미련 없이 차버리고 다른 사내를 찾거나 하이힐을 거꾸로 들고 찾아 나설 텐데
그저 옷고름을 씹으며 성황당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통곡을 하느니 보다 차라리 더 애절하다.
마무리가 기가 막히다.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내의 맹세, 그 알량한 헛된 맹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제도 또 오늘도... 떠나간 사내를 그리워하는 여인의 넋두리는
‘알뜰한 그 맹세’로 알뜰하게 표현되었을 뿐 원怨이나 한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복수와 저주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내가 돌아오면 뛰어가 가슴에 안기고픈
여인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사를 알뜰하게 표현한 것이다.
성황당 길에 제비 들은 저리도 잘 넘나드는데 이제나 돌아올까 오늘도 기다려 보지만
무정한 사내는 끝내 오지 않고, 절절한 서러움을 속으로 삭히며 옷고름을 곱씹으니...
아, 어쩌랴... 그렇게 봄날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시작하는 가사가 더없이 화사한 만큼 마무리의 애절함은 한층 배가倍加 된다.
참으로 기막힌 콘트라스트가 아닌가?
단순하게 늘어놓는 진부한 영탄조의 노래가 아니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연분홍’ 치마를 ‘여인네의 절절한 서러움’과 치환置換시킨
작사가의 풍류가 가슴을 휘젓는다.
오리지널 백설희의 노래도 좋고 국민가수 조용필의 노래도 가슴을 찢지만
나는 백설희와 동년배였던 여가수 장세정의 노래가 더 좋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쯤 전인가?
MBC-TV에서 “그리운 그 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때 이미 “그리운” 옛 노래였으니 지금은 얼마나 오래된 노래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나는 그때 한참 햇병아리 PD로 바닥을 길 때인데 그 때 장세정이 이 노래를 불렀다.
백설희나 황금심의 간드러지는 기교는 없이 아주 담담하게 불렀다.
그 때는 그저 많은 옛 노래 중의 하나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다.
노래를 마친 장세정이 분장실로 돌아와 말없이 말보로 한 가치를 꺼내 물고
던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깊이 빨던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있다.
- 요즘은 그렇게 새빨간 립스틱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하나의 궁금증과 만나게 된다.
이 노래를 왜 요즘에야 -이제서 야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그 때는 별로이던 것이 새삼스레 지금 엎어지는 것은 왜일까?
나는 왜 변한 것일까?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라면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린다.
올 봄에는 황학동 중고시장에서라도 장세정의 LP를 구해봐야겠다.
물 끓는 소리...
라면봉지 뜯는 소리...
창문 너머로 박새 지저귀는 소리...
그렇게 관수재의 봄날은 가고 있다.
내용이 다소 긴듯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봄날은 간다>
봄이 왔다.
강화의 매서운 바람을 용케 견뎌낸 목련가지에 꽃망울이 수줍게 솟아 있다.
서울보다 1주일은 늦으니 아직도 보름이나 지나야 터뜨릴 것이다.
대지에는 이미 들풀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고 있고 산수유는 노랗게 꽃을 피웠다.
관수재 주변의 땅은 한 삽 파면 절반 이상이 돌덩이다.
풀 한 포기 심으려고 해도 땅파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나무를 심는 일은 뿌듯하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무슨 엄청나게 기대할 미래가 있을까마는 그래도 나무를 심는 것은 기분 좋은 노동이다.
어찌 어찌 나무를 다 심고 나니 벌써 한 낮이다. 아침도 거른 탓인지 몹시 허기가 진다.
라면 물을 불에 올려놓고 LP 한 장을 걸었다.
만토바니 악단의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 판에서 ‘봄의 소리’에 바늘을 맞췄다.
아직 한기가 있는 관수재 거실에서 진공관식 앰프의 빨간 시그널이 따뜻함을 준다.
나는 어렸을 적에 ‘나의 살던 고향’을 즐겨 불렀다.
특히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이라는 가사를 좋아했다.
어린 탓에 살구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이름에서 오는 꿈같은 화사함을 좋아했다.
대학 때는 “록키산의 봄”이라는 노래를 좋아했다.
당시에는 팝송이 유행하던 때였다.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y. I'll be coming back to you” 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가보지도 못한, 록키산에서 펼쳐지는 로맨틱한 사랑을 그저 상상하며 즐겨 불렀다.
비발디의 ‘사계’ 중 1악장 ‘봄’과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 ‘봄의 소리’도 빼 놓을 수 없다.
‘봄의 소리’왈츠는 처음 들어가는 도입부부터 아주 경쾌하게 시작된다.
짠! 짜자잔 짜자잔, 짠 찬 찬~ 하고 시작되는 인트로는 마치 춥고 음산했던 겨울의 장막을
한 순간 거침없이 치고 나오는 듯한 봄의 생동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는 아주 엉뚱하다.
엉뚱하다는 것은 소위 뽕짝이라고 부르는 트로트를 별로 즐기지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을 노래한 하구 많은 트로트 중에서 하필 ‘봄날은 간다.’일까?
이 노래는 박시춘 씨가 손로원 선생의 가사에 곡을 붙였는데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아주 일품이기 때문이다.
노랫말 처음부터 들어보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 날리더라”
분홍빛이 어떤 색깔인가?
영어로는 pink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pink보다는 분홍이 훨씬 감미롭고 가슴에 젖는다.
그냥 분홍도 아니고 연분홍이다.
연분홍!... 듣는 이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 색깔이 아닌가? 말해 무엇 하랴.
싱그러운 여인의 몸을 휘감은 연분홍빛 치마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에 휘날린단다.
그것도 봄바람에... 얼마나 가슴 설레고 볼이 달아오르는 표현인가?
이쯤이면 화사한 봄날에 들뜬 젊은이들의 춘흥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노래를 들어보면 화사하기 보다는 차라리 애절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 무슨 조화인가?
조금 더 들어보자.
“미미미 라라시 도도시라♬” 단음계로 나가는 폼이 심상치 않으니 말이다.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 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옷고름을 씹는다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하기 사 옷고름이 무언지 조차 모르는 젊은이도 많을 테니...
오직 지아비에 대한 순종과 인종이 여인의 덕목이던 시절, 기쁠 때나 반가울 때,
서러울 때나 분노가 치밀 때 여인들은 그저 애매한 표정으로 옷고름을 씹을 뿐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슴속으로 질끈질끈 씹어 삼키는 것이다.
성황당 길도 실로 의미심장하다.
성황당 길은 원래 인적이 드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요즘처럼 자유분방한 연애는 생각도 못하던 그 시절,
처녀 총각이 남모르게 밀회를 즐기기에 이처럼 적당한 곳이 없었으리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울고 웃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던,
인적이 드문 성황당 길에서 (기껏) 손을 꼭 잡고 사랑을 맹세 하던,
그 사내는 무정하게도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요즘 같으면 미련 없이 차버리고 다른 사내를 찾거나 하이힐을 거꾸로 들고 찾아 나설 텐데
그저 옷고름을 씹으며 성황당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통곡을 하느니 보다 차라리 더 애절하다.
마무리가 기가 막히다.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내의 맹세, 그 알량한 헛된 맹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제도 또 오늘도... 떠나간 사내를 그리워하는 여인의 넋두리는
‘알뜰한 그 맹세’로 알뜰하게 표현되었을 뿐 원怨이나 한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복수와 저주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내가 돌아오면 뛰어가 가슴에 안기고픈
여인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사를 알뜰하게 표현한 것이다.
성황당 길에 제비 들은 저리도 잘 넘나드는데 이제나 돌아올까 오늘도 기다려 보지만
무정한 사내는 끝내 오지 않고, 절절한 서러움을 속으로 삭히며 옷고름을 곱씹으니...
아, 어쩌랴... 그렇게 봄날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시작하는 가사가 더없이 화사한 만큼 마무리의 애절함은 한층 배가倍加 된다.
참으로 기막힌 콘트라스트가 아닌가?
단순하게 늘어놓는 진부한 영탄조의 노래가 아니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연분홍’ 치마를 ‘여인네의 절절한 서러움’과 치환置換시킨
작사가의 풍류가 가슴을 휘젓는다.
오리지널 백설희의 노래도 좋고 국민가수 조용필의 노래도 가슴을 찢지만
나는 백설희와 동년배였던 여가수 장세정의 노래가 더 좋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쯤 전인가?
MBC-TV에서 “그리운 그 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때 이미 “그리운” 옛 노래였으니 지금은 얼마나 오래된 노래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나는 그때 한참 햇병아리 PD로 바닥을 길 때인데 그 때 장세정이 이 노래를 불렀다.
백설희나 황금심의 간드러지는 기교는 없이 아주 담담하게 불렀다.
그 때는 그저 많은 옛 노래 중의 하나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다.
노래를 마친 장세정이 분장실로 돌아와 말없이 말보로 한 가치를 꺼내 물고
던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깊이 빨던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있다.
- 요즘은 그렇게 새빨간 립스틱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하나의 궁금증과 만나게 된다.
이 노래를 왜 요즘에야 -이제서 야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그 때는 별로이던 것이 새삼스레 지금 엎어지는 것은 왜일까?
나는 왜 변한 것일까?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라면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린다.
올 봄에는 황학동 중고시장에서라도 장세정의 LP를 구해봐야겠다.
물 끓는 소리...
라면봉지 뜯는 소리...
창문 너머로 박새 지저귀는 소리...
그렇게 관수재의 봄날은 가고 있다.
2008.04.14 16:46:40 (*.172.108.5)
나훈아씨가 일본공연시 불렀던 동영상같습니다..."봄날은 간다"
(좌측상단의 Esc키나 위 음악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감상하세요)
* 나훈아 / 봄날은 간다
(좌측상단의 Esc키나 위 음악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감상하세요)
* 나훈아 / 봄날은 간다
2008.04.15 05:42:17 (*.172.108.5)
호문이누나는 불러놓고 어디 가신겨?
“봄날은 간다” 동영상 더 올립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밑에 양국이형글에서던가? 봄날은 간다 이야기가 있더군요.
시에틀에서 셋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즐감하세요.(마찬가지로 Esc키나 위 음악 정지 버튼 누르시고...)
* 백설희선생님이 부른 원조 “봄날은 간다”입니다.
* 장사익 / 달맞이 꽃,봄날은 간다(2번째 곡입니다.)
* 김수희 /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동영상 더 올립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밑에 양국이형글에서던가? 봄날은 간다 이야기가 있더군요.
시에틀에서 셋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즐감하세요.(마찬가지로 Esc키나 위 음악 정지 버튼 누르시고...)
* 백설희선생님이 부른 원조 “봄날은 간다”입니다.
* 장사익 / 달맞이 꽃,봄날은 간다(2번째 곡입니다.)
* 김수희 / 봄날은 간다
2008.04.15 09:16:31 (*.212.83.27)
동상 ! 나 여기 주일 섬기고 나오느라고 !
오늘 맨 위에 봄날을 한 두어시간 째 지금도 들으면서 ~ 흥얼 거리면서 두드리고 있구먼
동상 얼굴도 떠 올리면서 ~
헌디 10기에 가면 329 친구야 모여라에 올린 Celine Dion I'm alive 를 반복해서
올려줄수 있어 ? 이것 신청곡이야 10기에 올려진것은 내컴으론 어떤때는 나오고 어떤때는 아예 깜깜이라
11 안 광희가 반복으로 올렸다는데 내컴은 도무지 ! 혹 ! 요 자리에 올리면 계속 나오려나 해서 청계천 잘 있지?
오늘 맨 위에 봄날을 한 두어시간 째 지금도 들으면서 ~ 흥얼 거리면서 두드리고 있구먼
동상 얼굴도 떠 올리면서 ~
헌디 10기에 가면 329 친구야 모여라에 올린 Celine Dion I'm alive 를 반복해서
올려줄수 있어 ? 이것 신청곡이야 10기에 올려진것은 내컴으론 어떤때는 나오고 어떤때는 아예 깜깜이라
11 안 광희가 반복으로 올렸다는데 내컴은 도무지 ! 혹 ! 요 자리에 올리면 계속 나오려나 해서 청계천 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