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회 | 포토갤러리 | - 게시판담당 : 박화림
글 수 1,334

주말 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88)이
런던 자택에서 전화를 받았다.
“노벨상을 받아서 기쁘냐고요? 온갖 상 중에서 가장 화려한(glamorous) 상이긴 하죠.
하지만 난 이미 거의 모든 문학상을 탄 걸요. 놀라긴 했지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지난 11일 스웨덴 한림원이 레싱을 올해 노벨상 수상자로 호명했을 때 그녀는 가게에 가고 집에 없었다.
청색 체크무늬 셔츠에 펑퍼짐한 긴 치마 차림으로 귀가하는 레싱을 기자들이 에워쌌다.
레싱은 현관 앞 층계에 털썩 주저앉아 즉석 회견을 했다.
그녀의 일성(一聲)은 대략 이랬다.
“노벨상은 ‘로열 플러시(Royal Flush·포커놀이 할 때 가장 좋은 패)’ 같은 상이죠.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우쭐대며 들떠야 하나요?”
그때 이미 집안에선 미친 듯이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고 한다.
문우(文友)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바다 건너에서 축하 전화를 했다.
기자들과 가족들 전화도 쏟아졌다.
레싱은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다음 전화가 걸려와서 벌써 며칠째 전화기 앞에 붙들려 있다”고 말했다.
책과 잡지가 곳곳에 산처럼 쌓인 이 붉은 벽돌집에서 레싱은 중년에 접어든 고양이 한 마리, 환갑을 바라보는 병든 막내아들과 함께 살아왔다.
노벨상 발표 직전, ‘알프레드와 에밀리’라는 신작 소설을 탈고한 곳도 여기다.
―평생 쉬지 않고 50편 넘는 작품을 썼습니다.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어린아이 때부터 줄곧 인간을 관찰하고 글을 썼어요.
글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좋지 않았어요.
나는 이란에서 태어났고, 채 다섯 살이 되기 전에 러시아, 발트해 연안국가들, 영국, 독일을 여행하다 아프리카에 정착했어요. 늘 이리저리 옮겨 다녔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 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곰곰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문학에 생애를 바쳤습니까?
“그렇게 타고났으니까요. 관찰하고 쓰는 것이 내 재능이었어요.”
―평생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언제였지요?
“아버지는 1차 대전 때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내 어린 시절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요, 그때가 가장 무겁고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나이 서른에 아프리카를 떠나 런던에 정착한 다음, 셋집에 살며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나는 열심히 썼어요. 어떤 책은 즐기면서, 어떤 책은 고생하면서. 그러나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그 수고가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평론가들은 젊은 레싱을 또래의 다른 작가들과 묶어서 ‘성난 젊은이들’(Angry Young Men)이라고 불렀다.
레싱은 공산당원이었다. 반핵 운동을 격렬하게 했다.
1962년에는 ‘페미니스트들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소설 ‘황금 노트북’을 냈다.
그녀는 문체와 형식과 소재에 있어 평생 실험과 변신을 거듭했다.
국내에 소개된 작품만 해도 사실주의적인 장편 ‘다섯째 아이’(민음사), 환상 소설 ‘생존자의 회고록’(황금가지), 고양이에 대한 에세이 ‘고양이는 정말 별나 특히 루퍼스는’(예담), 연애에 대한 단편집 ‘난 당신과 자지 않았어요’(거송미디어) 등 한 사람이 썼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주제·문체·소재가 다양하다.
―공산주의자·사실주의자·탈식민주의자·신비주의자·여성주의자…. 당신에게 붙은 수많은 꼬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수고를 면하려고 꼬리표를 붙여요.
난 언제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작가는 그저 쓸 뿐이죠. ‘나는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내 속엔 언제나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넘쳤고, 그 모든 이야기를 저마다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썼을 뿐이에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후세가 날 어떻게 기억하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하루 일상은 어떻게 보냅니까?
“바빠요. 젊었을 땐 늙으면 한가할 줄 알았는데…. 늘 글 쓰느라 바쁜 건 아니에요.
글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탈이죠.
내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글 쓰느냐’는 식으로 일과를 묻는 거라면, 내겐 그런 일과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엔 지붕 고치는 사람이 올 거예요.
수요일엔 1박2일 여행을 갈 거고요.”
레싱은 “내겐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 많다”고 했다.
60년대에 그녀의 집은 ‘오픈 하우스’라고 불렸다.
레싱의 지인은 물론 아들의 친구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레싱이 차려주는 밥을 얻어먹었다.
레싱의 아들은 투병 중이다.
나이든 병든 아들을 간병하는 일이 현재 이 노대가가 가장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 일이다.
―노년은 어떤 느낌입니까?
“여성호르몬에 대해 묻는 거라면, 난 이제 서른 살이 아니에요.
다음 남편을 찾아다니는 단계는 벗어났지요.
한 인간으로서 나는 이제 나 자신이 편안해요.
물론 늙으면 몸이 약해지지요. 젊음과 육체적 힘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여성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여성으로서 글을 쓴 게 아니었어요. 작가는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쓰지요.”
―신작 ‘알프레드와 에밀리’는 부모의 이름을 딴 작품이지요. ‘용서’에 대한 소설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난 이제 부모님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젊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요.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용서한다’고 툭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대단해요.
내겐 그게 늘 힘들었어요. 용서는 좋은 일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회한을 지고 다녀야 하니까요.
용서와 이해가 같은 말이냐고요? 그렇지요.
그럼 이해해서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다’(happy)는 말, 굉장히 바보 같은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낱말이죠.”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도리스 레싱과의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에서>
2007.10.24 16:48:21 (*.173.16.117)
내가 만일 기자라면 인터뷰 기사만을 쓰는 기자이고 싶다.
아마도 레싱처럼 인간이라는 깊은 동굴을 탐험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일거야.
80세가 넘은 사람들을 조금 에브노멀하게 생각하는 편견이 내게 있었나봐
아니 많이 봐줘 80세였지 ::$
그런데 88세 노인의 명석한 답변이라니!!
`물론 늙으면 몸이 약해지지요. 젊음과 육체적 힘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늙어가는 인생항로에 두고두고 많은 위안을 줄 답변이다.
또,`용서는 좋은 일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회한을 지고 다녀야 하니까요.
용서와 이해가 같은 말이냐고요? 그렇지요.
그럼 이해해서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다’(happy)는 말, 굉장히 바보 같은 단어예요`
행복하다는 말이 바보같은 단어라는 게 왜 이리 공감이 되는 거니?
파파 할머니에게 마음을 뺴앗길 수도 있구나(x1)
아마도 레싱처럼 인간이라는 깊은 동굴을 탐험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일거야.
80세가 넘은 사람들을 조금 에브노멀하게 생각하는 편견이 내게 있었나봐
아니 많이 봐줘 80세였지 ::$
그런데 88세 노인의 명석한 답변이라니!!
`물론 늙으면 몸이 약해지지요. 젊음과 육체적 힘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늙어가는 인생항로에 두고두고 많은 위안을 줄 답변이다.
또,`용서는 좋은 일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회한을 지고 다녀야 하니까요.
용서와 이해가 같은 말이냐고요? 그렇지요.
그럼 이해해서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다’(happy)는 말, 굉장히 바보 같은 단어예요`
행복하다는 말이 바보같은 단어라는 게 왜 이리 공감이 되는 거니?
파파 할머니에게 마음을 뺴앗길 수도 있구나(x1)
2007.10.24 22:20:59 (*.204.58.38)
경선아~
요즘 네 글이 안 올라와있길래 어디 여행간줄 알았다.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네가 올린 이 글 잘 읽었어.
이분 정말 대단한 작가시다.
세상에서 젤 아름다운 말은 "용서"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도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는 너무도 힘든 단어가 되더라.
"알프레드와 에밀리" 라는 책 꼭 읽어보고 싶어진다.
요즘 네 글이 안 올라와있길래 어디 여행간줄 알았다.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네가 올린 이 글 잘 읽었어.
이분 정말 대단한 작가시다.
세상에서 젤 아름다운 말은 "용서"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도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는 너무도 힘든 단어가 되더라.
"알프레드와 에밀리" 라는 책 꼭 읽어보고 싶어진다.
2007.10.24 22:58:46 (*.173.16.117)
화림아~
두발 달린 것에 도전하느라 시간을 꽤 투자했댔어.
예순 넘으면 못배울 것 같드라구.
자전거 배워서 탈 줄 안다고 자랑해대니까 어느 후배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대개 육십이 넘어 보이던데 왜일까요?하고 묻더라.
정말 왜일까?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서
더 늙기 전에 꼭 도전해야할 것 같은 부채감에서 놓여난 후~련~함을 맛봤다 ㅎㅎ
앞으로는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마음의 근육을 키울 예정이다.
레싱 작가의 인터뷰 답변 근사하지?
나도 그분의 책은 아직 읽지 못했어.
두발 달린 것에 도전하느라 시간을 꽤 투자했댔어.
예순 넘으면 못배울 것 같드라구.
자전거 배워서 탈 줄 안다고 자랑해대니까 어느 후배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대개 육십이 넘어 보이던데 왜일까요?하고 묻더라.
정말 왜일까?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서
더 늙기 전에 꼭 도전해야할 것 같은 부채감에서 놓여난 후~련~함을 맛봤다 ㅎㅎ
앞으로는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마음의 근육을 키울 예정이다.
레싱 작가의 인터뷰 답변 근사하지?
나도 그분의 책은 아직 읽지 못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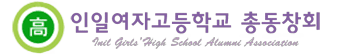




올려 준, 레싱이란 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 열심히 읽었어.
저 연세에도, 저렇게 자신감에 차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다.
어떤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자유로움과
인생의 대가 같은, 담대하고, 자신 만만한 태도는
늙었어도 정신적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 분의 말을 입증하는 것 같네.
작가는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쓴다는 말,
인간이 가진 편견에 대한 생각을 꼬집는 것도 같구.....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레싱이라는 분을 알게 해 주어 고마워!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