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회 - 아이러브스쿨 게시판담당 : 김영자
이어도는 바닷물 위로 솟아 있는 섬이 아니다
아마 예전에는 섬이 물 위로 보이다... 안보이다... 하면서 가라앉았는지, 우리에겐 전설의 섬과 같은 곳인데
바닷물 표층 수 밑에 있는 암반 이어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관측기지를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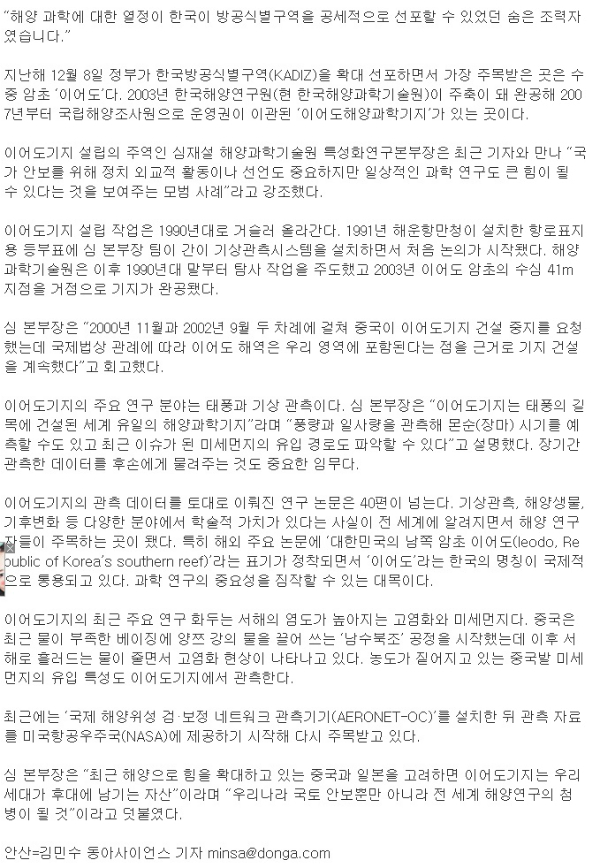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이어도 해양관측기지 모습은 아래와 같다 (그 아래는 이어도 탄생의 주인공 심재설 연구본부장의 모습).


우리나라에는 약 3000여개의 섬이 있는데.... 이 숫자는 바닷물 위로 솟아 있는 암반 모두를 센 것이다. 이중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은 700여개로 알고 있다. 반면..... 이어도 암초처럼, 바닷물 표층 밑으로 넓적하게 자리잡은 암반들이 있는데
그중 이어도 처럼 유명한 것이 동해의 대왕암 ! (=왕돌초 혹은 왕돌짬 이라고 다이버들에게 불림)
울릉도,독도 가는 길... 수심은 2,3000m 로 깊은데.... 그 중간의 왕돌초는 표층에서 30m 정도만 깊은 해저고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도 해양과학인들은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참고:서해의 평균 깊이는 50m 정도)
세종기지에 이어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고, 남극에 대륙기지를 건설하는 나라로 손꼽히게 된 지금
확실히 이순신, 장보고 후예들이 뭔가 다름을 <이어도 기지>로 자긍심을 높이게 되었다. 이어도에서 보았듯이.... 해안선과
지도는 세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어느 바다는 점점 넓어지고 어느 바다는 점점 사라지고.....어쩜 우리 생애중
서해바다가 없어질런지도....(=하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쌓이니....).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기후 변화 인데 그 내용중
해안선의 상승(=변화), 주목할 일이다. (참고: 7유순애는 위 해양과학연구원 전신인 KIST부설 해양개발연구소에 1976,7
위촉연구원으로 (관악산에서 대학원생인 동시에) 우리나라 3면 바다 연안의 해조식생 및 해중림+해조숲 등에 대해서 연구)

그러니.... 이 <口傳>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전의 어떤 진실에 기인함을 (현재 확인할 길 없더라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생물학자들이 종합탐사를 떠날 때는 뜻밖에 (민속학자 그리고 지질학자)를 팀 구성에 반드시 넣는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어도 얘기를 하냐하면..... 과학계 인터넷 신문 오늘자로 들어온 내용이어서요)
아, 생물학계에서도 구전을 그렇게 대우하시네요
난 옛것을 허물어내리고 새로 짓는 건설계통에서만 그리 하는 줄로...
전에 비상리 비하리란 이름의 동네에 공항건설을 계획한다는 뉴스에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때때로 올려주시는 새로운 지식과 현상들,
그때마다 아하..... 하고 잠시나마 녹슬어 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니,
십수년 전에 마감했던 과학동아... 다시 정기구독할까... 생각 중입니다.
비전문가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수준의 전문적인 잡지라고 생각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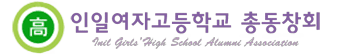




바로 그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전설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는데
과학으로의 이어도기지가 계획되고 완성된 것도 대단한 애국의 성과이고 국력의 과시지만
제주도 해녀들의 애환을 노래한 구전민요 이어도타령..
그녀들의 한숨 섞인 심정이 느껴지는 가슴 아려오는 노래입니다..
*******************
이어도타령 [ ─打令 ]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부르는 구전민요.
종류 : 민요(제주도)
'이어도사나' 또는 '해녀노래'라고도 한다.
작자 미상의 구전민요로
제주도 해녀들이 바닷일을 하기 위해 바다를 오갈 때 부르는 일종의 노동요이다.
해녀들의 한과 그리움을 달래는 노래로서 강한 사투리와 억양이 특징적이고,
이별이 없는 영원한 이상향에 대한 바다여인들의 염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래마다 사설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장단도 굿거리·중모리 등 다양하나
주제에는 큰 차이가 없다.
널리 알려진 《이어도타령》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이엿사나 이여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가는 건 솔남의 배여
잘잘 가는 건 잡남의 배여 어서 가자 어서 어서
목적지에 들여 나가자 우리 인생 한번 죽어지면
다시 전생 못하나니라 원의 아들 원자랑 마라
신의 아들 신자랑 마라 한 베개에 한잠을 자난
원도 신도 저은 데 없다 원수님은 외나무다리
질은 무삼 한질이든고 원수님아 길막지 마라
사랑 원수 난 아니노라.
이 노랫말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엇사나, 이어도사나, 이엇사나, 이어도사나(노 저을 때 내는 여음)/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떠가는 것은 소나무배여/
잘도 가는 것은 잣나무배여.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목적지에 닿도록 나아가자. 우리 인생은 한번 죽으면/
다시 환생하지 못하느니라. 원님의 아들 원 자랑하지 말아라/
신의 아들은 신 자랑을 말아라. 같은 베개에서 한숨을 자고 나니/
원도 신도 두려울 데 없다. 원수님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길은 무슨 같은 길인가? 원수님아, 길을 막지 말아라/
사랑도 원수도 나는 만들지 않겠노라.
사설이 직설적이며, 반복법을 많이 사용해 억양이 드세고 역동적이다.
제주도 해안에서만 전승되는 여성노동요로 해녀들의 생활상과 애환이 잘 드러나 있다.
노래가사에 나오는 '원수님'은 풍랑과 같은 자연재해를 뜻하는데,
길을 막지 말라고 하는 대목에서 직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해녀들의 형편을 알 수 있다.
특히 죽음을 가정한 해녀들의 심정이 남성에 대한 애정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며,
사후 세계에서 이승의 애환이 해결되리라는 희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두산백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