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강사 : 홍순민 교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방송 일정 :
2013년 9월 5일, 9월 12일, 9일 19일, 9월 26일
[TV] 매주 목요일 밤23시15분
[PLUS2]매주 일요일 낮10시30분(재)
강의 취지
?
“한양도성, 조선을 담다”
-제 1강 “한양, 왕도가 되다”
목멱산(현 남산) 자락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에서 어떤 시설물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것은 바로 한양도성의 자취였다. 당시 도성을 가꾸는 것은 수도인 한양을 가꾸는 것이었고, 도성을 완비했다는 것은 조선의 체제를 완비했음을 의미했을 정도로 조선시대에서 도성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한데. 한양도성은 무엇이며 왜 그 자리에서 발견되었을까? 한양도성을 따라 한양의 역사,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추적해 보자.
서울은 조선의 수도이자, 대한제국을 이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기까지 불변의 수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도가 되기 전의 명칭은 ‘한양’ 이었는데. 한양이란 북한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애초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태조 즉위 이후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태조실록을 보면, 당시 무악 (현재는 경복궁 뒤편)을 두고 “형세도 좋은데 하물며 조운이 통하고 전국으로 가는 길이 균등하다”라고 하며 도읍지로 정했다.
한양을 새 수도로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건설해야 했던 핵심 시설은 종묘, 궁궐, 도성이었다. 종묘란, 조종을 받들어 모시고 효성의 마음, 공경의 자세를 높이는 곳이며, 궁궐이란, 임금의 존엄을 드러내 보이고 정치적, 행정적인 왕명을 전달하는 곳이다. 또한 성곽(도성)은 나라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곳이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요소, 수도이자 왕도인 한성부에만 있는 시설이다. 실제 건설 공사도 종묘, 궁궐, 도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묘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며, 왕실 뿐 아니라 온 관원이 제사에 참여했던 국가의 사당이었다. 궁궐은 ‘임금이 사는 곳’이며 통치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리고 궁궐 다음에 쌓은 것이 도성인데, 내사산을 따라 쌓았다. 내사산이란 백악산(현 북악산), 타락산(현 낙산), 인왕산, 목멱산(현 남산)을 일컬으며, 내사산 중심에 흐르는 내수 (현재의 청계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로써 태조는 내사산 능선을 따라 한양도성을 짓게 된 것이다. 태조 때 흙으로 지었던 것을 세종대에 와서 돌로 다시 축조하게 되었다. 세종 4년, 도성을 고쳐 쌓는 일은 한달 만에 거의 마치는 단계에 이르렀고, 2월 23일에는 역사를 마쳤다.
도성에는 사대문과 사소문, 그리고 여러 개의 암문이 있었다. 사대문은 흥인문(동), 돈의문(서), 숭례문(남), 숙정문(북)을 뜻하며 이것은 각각 인, 의, 예, 지를 가리킨다. 인의예지는 ‘사단’이라고 하여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4대 덕목으로 손꼽혀왔다. (사람이 잃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도리는 ‘오상’이라고 하며 인의예지와 더불어 ‘신’이 꼽히는데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신각’이 있다.) 사소문은 광희문, 소의문, 창의문, 홍화문을 말한다.
조선의 체제를 완성했다는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서울 만들기”는 일단락되었다.
강의별 부제
?
제1강 “한양, 왕도가 되다”
?
제2강 “한양, 모양을 갖추다”
?
?
?
제 3강 “한양도성, 다시 서다”
?
제 4강 “한양도성, 성들을 거느리다”k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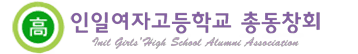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배워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