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회 - 게시판담당 : 김성자
가슴이 답답하여 창문을 여니,
달님이 환하게 웃으며 날 반긴다.
보름인가 보다.
달빛에 홀려 서둘러 겉옷 하나 걸치고 무작정 나서는데, 샤워하고 나오던 녀석이 묻는다.
"엄니, 어디 가셔요?"
"공원에~."
"이 밤에요? 같이 나가지요?"
밉지 않은 소리에 피식 웃으며, '금방 오마'하고 혼자 나선다.
늘 가던 어두운 성공회 길을 피해 가로등이 환한 홍예문 옆 층계를 오른다.
달빛에 홀려 나왔는데 인조 달님들이 대낮처럼 밝다.
달님은 저 가로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한참을 걷다 하늘을 보니 달님도 별님 하나 없이 홀로 날 따라온다.
달님도 외로운가 보다.
어린이날인데 애들은 재워놓고 어른들만 북적인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는데 나만 청승을 떠는 거 같아
운동하는 척, 손바닥을 앞으로 뒤로 촌스럽게 치면서 걷는다. ㅋㅋ 왕 소심녀.
답답한 가슴이 달빛 때문인지 시원한 바람 때문인지 좀 시원해진 듯하다.
그만 내려가야겠다.
"엄니, 한참 찾았네요."
"피곤한데 넌 왜 또 나왔어?"
"내일 일요일인데요. 뭘"
녀석이 어깨를 살짝 감싸는데 아~ 갑자기 달빛이 더 환하게 느껴진다.
컴컴한 길을 가도 무섭지가 않다.
단지 아들 녀석 하나 곁에 있을 뿐인데... 으쓱으쓱 ㅋㅋㅋ
녀석, 이렇게 에미를 감동시키는 녀석이 왜 여자 친구 하나 못 만들고 늙어가는지. ㅉㅉ
녀석의 신사도에 속 없는 에미는 혼잣말을 한다.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그려, 못난 이 에미는 지금 이 순간 네가 내 자식이라 행복하다."
여전히 달님은 우리 모자의 별 볼 일 없는 대화를 엿들으며 소리 없이 따라오고 있다.
ㅎㅎ 무슨 말쌈인지요.
자랑할 것 없는 왕창 촌스런 에미가
어린이날
늙은 아들과 모처럼 데이트했다고 자랑질 좀 했네요. 헤헤.
옥슨랑~~~
난 왜 자구 눈물이 나려하는지.....
고저 착한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글썽~~~~![]()
착한 아들 착한 남편둔 옥슨랑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여인!.....
옥순랑!!!!!!!!!!!!!!
달빛에 홀려서.
제목만 보고도 너무 낭만적이어서 마음이 푸근해 지는데
글을 읽다 보니 가슴 전체가 따뜻함으로 물결 치네.
녀석, 이렇게 에미를 감동시키는 녀석이 왜 여자 친구 하나 못 만들고 늙어가는지. ㅉㅉ
이 구절에 와서는 손뼉치며 동감하는 마음 이라오.
부디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엄마도 아들도 다 같이 행복 해지기를 바래요.
순영 언니,
부족한 글,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혼기를 놓치고 보니
이젠 오히려 아들 녀석 마음 다칠까봐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ㅠㅠ
따듯한 언니의 덕담이 좋은 인연을 몰고 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고맙습니다. ![]()
숨은그림찿기 잘 하는 아들아
그 밤중에 엄마 찿아내어 운치있는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
이제 색시감도 열씨미 찿았으면...
에미와 가끔 다니던 길 이니까 찾아냈지
색시감은 글쎄 올씨다네.
혹시 숨바꼭질 지루한 색시가 '까꿍'하고 나타나려나?
밤중에 산책나간 엄마를 찾아오는 아들이 흔하진 않지요.
엄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자상한 아들인 가 봐요.
하긴 달빛에 홀리는 어머니의 아드님이니~~~~~~~~~~~~~~~~~~~~~~~~~~~~~~~~~
속정이 깊은 거 같기는 한데 자상한 편은 아니라오.
명옥이도 아들만 키워 잘 알겠지만
딸 많은 집 분위기가 훨씬 화기애애하지.
그래도 아들 딸 다 가지신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들을 양복 입혀 내 보낼 때,
떡~ 벌어진 어깨가 주는 든든함은 딸과는 또 다른 기쁨이라고. ㅎㅎ
글쎄, 비교할 딸이 없으니 낸들 알 수가 있나....
저희 부모님 연배에서는 대개 그랬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든든함에서 아들과 딸은 비교도 안되었지요.
우리 성가대에 아들 딸 다 결혼시키신 형님이 그러시는데
일단 아들에게는 부모일이 내 일이고 딸은 아니래요.
집집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들있는 집 딸들에게 친정은 그저
편안하고 쉬러 가는 곳이지 친정일을 책임있게 할 의무는 적쟎아요?
우리 아들들도 자상함하고는 거리가 먼데
집안일에 대한 감각은 역시 자기집 중심이더라구요.
다행이 사돈댁도 든든한 장남이 버티고계셔서 뭐 별 문제가 없네요.
근데요.
손녀딸이긴 하지만 양지를 보면 정말 애교도 많고
엄청 귀염을 부리더라구요.
딸가진 아빠들이 고 재롱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자랄수록 큰 마음의 친구가 되겠고요.
전 제발 돈많은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니 하는 이야기들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으면 지부모에게도 장인장모에게도 다 잘해줄테고
무리해서 하는 거라면 아들이래도 사위래도 마음 편할 수 없는 건데
무슨 세상의 딸가진 부모들을 폄하해도 유분수지..................................
제대로 된 집안의 아들 딸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안그래요.
자기집은 아무래도 자주 할 일이 생기니 조금씩 자주 나가게 되고
가끔하는 장모님께는 번듯한 것 해드릴 수도 있는 거지 안그래요?
솔직히 딸들이라고 부모에게 다 잘 하는 줄 아시면 큰 코 다치지요.
시집보다 친정에 마음이 더 간다는 의미일 뿐!
사랑이 내리사랑이지 부모에게로 역류하는 거 봤슈?
다 지들생활이 우선라는 점에서 똑같다구요.
우린 안그랬나요?
조카들 봐도 친구집 봐도 아들이고 딸이고 아직은 챙겨가기 바쁘두만요.
애들한테 보낼 소포준비하느라 남편과 마트 다녀오면서 웃었다니까요.
뭐든지 부탁한 것의 두배에다가 이거넣고 저거넣고~~~~~~~~~~~~~~~~~~~~~~~~~~
"이거 자식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부탁 받은 거라면 엄청 열받쳤을 꺼다!"
인간이 다 이런 거 아뉴?
?맞어.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 십분의 일만 해도 효자지.
근데 사실은 효자란,
부모의 입에서 만들어지는 거래잖아.
섭섭하게 한 것은 혼자 감싸 안고
잘한 일만 남에게 얘기해서 효자를 만든다는 거지.
그런 효자 빼고 나면 진짜 효자는 얼마나 될까? ^^
줘도 줘도 또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명옥이처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아무튼 그댁 아드님들은 부모 복은 타고 난 사람들이야.
요즘 돌아가는 것만 보면 그렇게도 보이겠지요.ㅎㅎㅎ
애들 어릴 땐 정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경제는 물론이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키웠네요.
밥이야 열심히 해줬지만 지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돌아 볼 여력이 없었거든요.
특히 장남에게는 미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6살 짜리를 2년씩이나 떼어놓지를 않았나.............................................
그덕분에 우리 모자는 군대보낼 때는 아주 의연했어요.
그 어린 걸 말도 잘 안통하는 곳에 남겨둔 거에 비하면 남들 다 가는 군대 그것도 성인이 된 나이에 갔으니까요.
이런 저런 이유로 뭔가 자꾸 해주고 싶어집니다요.
옥순이 아들 "용택"인 어려서부터도 듬지막하니 기특했지.
근데, 시금치 말고, 아들들말이야 ![]()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란 말일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란 말일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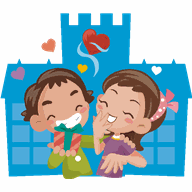

오메 멋진 거!!!!!!!!!!!!!!!!!!!!!!!!!!!!!!!!
언니네 아드님은 엄마가 너무 좋아서 다른 여자가 보이지를 않나봅니다.
참 이것두 문제네요.
시엄니들이 적당히 좀 촌스럽고 그래야지
너무들 잘나셨어요.
이러다 나중에는 아들에게 원망들으시겠어요.(샘이 나서 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