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회 | 포토갤러리 | - 게시판담당 : 박화림
顔淵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爲仁?이니
一日 克己復禮면 天下歸仁焉?하리니
爲仁由己?니 而由人乎哉?아
안연(공자의 제자)이 仁을 물었는데
공자님미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니
하루라도 克己復禮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仁을 실천했다고 할 것이니
仁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니 어찌 다른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겠는가
仲弓問??仁한데 子曰
出門如見大賓?하고
使民如承大祭?하며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
在邦無怨?하며 在家無怨?이니라
仲弓曰 雍雖不敏?이나 請事斯語矣?이리다
중궁이 仁을 물었는데 공자꼐서 말씀하셨다.
문밖에 나가서는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중히 남을 대하고
백성을 대할 떄는 큰제사를 받들듯이 공경을 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면
나라에 대해서도 원한이 없으며 집안에서도 원한이 없게 된다.
중궁이 말하가를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청컨데 이 말씀을 일삼겠습니다.
어릴적 부터 들어 귀에 딱지져 있는 말들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유교는 仁
그 지향점은 異音同意語로 생각해도 큰 탈은 없겠습니다.
극기복례하면 인을 행하는 것이요
상대방에 대해 敬을 지키고 恕를 실천하면 인을 행하게 된다는 말로 의미를 압축시킬 수 있겠지요
경(敬)이 무언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서(恕)는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한 용서, 이말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들린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라고 풀이하면 무난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개인적으로 한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자의 간결한 압축미에 있습니다.
`경`과 `서`와 `예`를 일상사에서 지킬 수만 있다면 인생사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이 없으니 지키기 무척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어디 한둘이겠냐만은 `경 서 예`이런 의미있는 글자를 되새겨보는 것은
특히 성숙을 위한 접근을 위해서도 노년에 좋을 듯 싶습니다.
더불어 忍(참을 인)이라는 글자 하나를 덧붙쳐 봅니다.
禮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태
無禮를 無視하는 無心도 忍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세상이 점점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즈음에
공자님의 말씀은 한번쯤 깊은 숨을 쉬면서 곰곰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존대말이 없는 미국에서도 "Respect" 라는 말을 어렸을때 부터
누누히 강조하는걸 보면 상호간의 ( 어떤 관계이던간에)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질서를 유지 할 수있다는 생각은 동 서양이
많이 다르지 않음을 느낌니다.
너무나 간결하여 오히려 어려운 한자들이
이제 어떻게 읽는지도 점점 가물 가믈 해지고
헷갈리는 때에 좋은 말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는 존중과 이해가 성립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겠지요.
극기복례(克己復禮)가 바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논어의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읽고 느끼면 여럿이 나누고 싶은 뿌리깊은 병..........혜경언니의 예의있는 댓글을 읽으니
부끄러움이 많이 흐려지네요 ㅎㅎ
우리 SB의 글은 ......
일상을~
검둥개 멱감 듯 ,
벌쐰년 싸댕기 듯,
살아 나가는 나에게
웬지 워~워~ RELAX~~~!!! 하라는 무언의 저지 인 듯 하야
슬며시 무안해지며 고마움의 미소를 짓게 하는 마력이 있어.
분기별로 한번씩 제정신이 찾아와 아름다운 영상,
음악과 글에 심취해 있는 ![]() 한 이시간....
한 이시간....
(우짜자고 앞동 16층에선 이삿짐을 날라
나으 모처럼 사색의 즐거움을 깨놓는것이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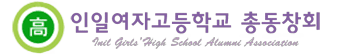




경선아,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유교는 仁
그 지향점은 異音同意語로 생각해도 큰 탈은 없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문의 압축된 의미를 성현의 말씀으로 되세기게 해주니
고맙다.